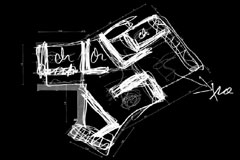"건축은 '시대의 화석'이다"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올해 수상자 장 누벨 인터뷰
- ▲ 장 누벨이 웃는 사진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그런 그가 웃었다.“ 내가 근엄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근엄한 나 를 좋아할 뿐이라오.‘ 인간’장 누벨은 이렇게 웃어요.”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삼성미술관 '리움' 공동 설계 등으로 한국과 인연을 쌓아온 그가 최근 한화건설이 뚝섬 서울숲 지역에 지을 예정인 고급주상복합 '갤러리아 포레'의 인테리어를 맡았다. 장 누벨이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건물의 내부 디자인만 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
- ▲ 장 누벨이 스케치한 갤러리아 포레 도면.
―이번 갤러리아 포레 프로젝트는 건물 내관만 디자인하는 것으로 안다. 건축가로서 이례적인 결정인 것 같다.
"다른 조건보다도 전망이 환상이었다. 강과 산, 숲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은 극히 드물다. 이런 자연 풍경을 활용해 인테리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실내에 서울의 산과 강을 미니어처처럼 만든 화단을 만들어뒀다. 이 화단 뒤로 진짜 한국의 강산이 펼쳐진다. 실내 조경이 외부로 연결되고, 동시에 바깥 풍경을 차경(借景)하는 방식이다."
- ▲ 카메라 조리개처럼 빛을 조절하는 창을 적용한 파리의 ‘아랍문화원’.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건축물이다.
"사실 그런 면은 생각하지 않았다(그는 단호하고 솔직했다). 시공사에서 난방 등의 시스템은 지었고 나는 공간 연출에 주안을 뒀다."
―당신 같은 스타 건축가들이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나는 한국에서 꽤 많은 작품을 했다. 적어도 서른 번 이상 한국에 왔다. 리움도 설계했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의 저택과 자제분의 집도 지었다(이 전 회장의 집 구조를 묻자 그는 "일급비밀이라 도면도 다 없앴다"며 함구했다). 온돌 문화 같은 한국의 주거문화도 그때 많이 알게 됐다. 그 나라의 문화 반영도 중요하지만 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스타일을 제안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도 서양식이 보편화돼 있지 않는가.
- ▲ 파리의 신개선문 왼쪽에 들어서는‘투르 시냘’.‘ 에펠 탑의 라이벌’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다른 스타일의 모더니즘, 새로운 '럭셔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바깥 자연을 더 잘 즐기기 위해 '공간을 비우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방 하나를 나눠 공간을 복잡하게 구성하는 방식을 피했다. 거실 벽면에 설치한 투명·반투명·불투명 소재의 모듈로 된 수납장을 옆으로 밀면 안방이 나온다. 벽을 통해 방이 나오고, 이 방으로 확 트인 공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대니얼 리베스킨트, 노먼 포스터 등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파리 라데팡스의 신(新)개선문 옆에 지을 예정인 '투르 시냘(Tour Signal)'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 '에펠탑의 라이벌'이 될 기념비적인 건물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아파트 문화를 새로 쓰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아파트 단지가 대중에게 오픈돼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 건물은 아파트 외에 비즈니스센터·호텔·오피스가 함께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다. 물질적인 부만 좇는 부르주아가 아니라 삶과 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부르주아상을 제시하고 싶었다."
- ▲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총알 모양의‘아그바 타워’. 고층 빌딩이지만 창을 여는 것을 좋아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기호를 고려해 외부창을 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장 누벨 제공
―아랍문화원·아그바 타워·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건축 중) 등 주요작을 보면 빛의 투영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돼 있다. 당신의 건축에서 빛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빛·그림자·투명성은 내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파리에 있는 생 샤펠(St. Chapelle)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색색깔의 유리를 투영되는 빛의 아름다움이란…. 빛의 영감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꼭 생 샤펠에 가보길 권한다. 난 무신론자이지만(웃음).
―언제부터 건축가의 꿈을 키워 왔는가.
"다섯 살 땐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 소방관 옷이 그저 멋있어 보였다. 좀 더 머리가 굵어졌을 땐 그냥 불을 지르고 다니고 싶었다(웃음).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편을 잡고 계셨다.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엄청 심했지만 이젠 그 누구보다 좋은 후원자이다. 그러고 보니 두 분이 어느새 여든여덟, 여든일곱이다. 큰아들은 일본에서 컴퓨터공학을 배우고 있다. 얼마 전에 봤는데 벌써 머리가 나처럼 벗겨져 어찌나 미안하던지(그는 매끈한 머리를 문질렀다)….
―예술가이면서도 시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르몽드·리베라시옹 등 대부분의 신문을 매일 정독한다. 하루라도 신문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그는 신문광이다. 이번에도 비닐 봉지에 신문 수십 부를 넣어 들고 인천공항에 나타나 시선을 끌었다). 신문을 보면서 전 세계의 뉴스를 본다. 뉴스는 '라이브'다. 세계의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런 것들이 작품의 토양이 된다."
― 당신에게 건축은 무엇인가.
"건축은 문화를 찍어내는 거푸집 같은 것이다. '그 시대의 화석'인 셈이다."
김미리 기자 miri@chosun.com *^^*
'08_경제_建_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의 멋지고 재미난 다리 10선 (0) | 2008.10.31 |
|---|---|
| 무게 1500t 성당_통째로 75.6m 이동 (0) | 2008.10.21 |
| 최진실 작품들을 떠올리며.... (0) | 2008.10.03 |
| 최진실의 드라마 같았던 삶 (0) | 2008.10.03 |
| 김수현작가_<엄마가 뿔났다>에 뿔난 사연 (0) | 2008.09.26 |